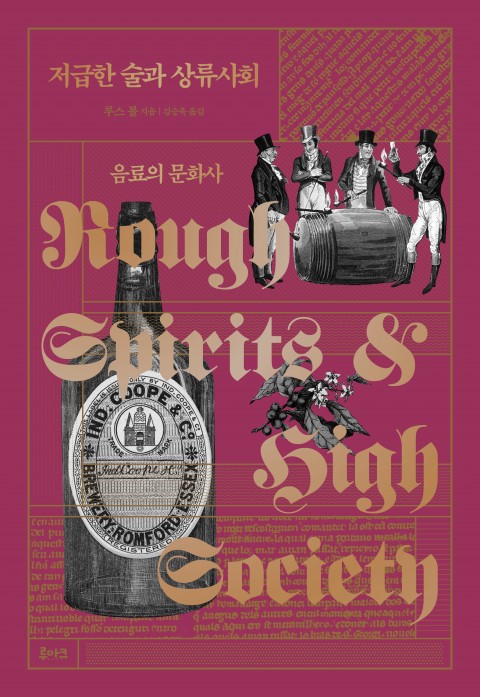
술에 대한 책이라고는 하나 사실 술 자체에 대하여 이 책이 말해주는 바는 별로 없다. 하긴 제목부터 ‘저급한’ 술을 언급하고 있으니 저자 스스로 미식 이야기와는 처음부터 거리를 둔 셈이다. 그렇다고 본격적으로 안주 얘기를 한다면 식도락 서적의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니 역사 코너에 꽂혀 있는 이 책이 다룰 수 있는 영역은 결국은 술을 먹는 장소다. 결국 이 책에서 ‘저급한’ 술은 그 시대의 서민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술에 다름아니고, 책은 그 시대의 민중들이 어디에서 술을 주로 마시게 되었으며 그 장소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경위를 꽤 상세히 설명한다. 상대적으로 저급한 물건을 취급하는 상인들이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이자 그 짐꾼들의 숙소 역할을 하는 여관에서 짐꾼들은 저렴하게 에일 – 오늘날의 에일과는 좀 다른 – 맥주를 마셨다는 등.
그리고 그 술을 먹는 장소는 동시에 사람들이 만나고 그 시대의 크고 작은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가 된다. 에일을 마시던 여관은 이후 선술집이 되었고, 서민들이 모이는 선술집은 길드에 들 기술은 없는 혈혈단신들이 직업을 구하는 장소가 되었으며, 전당포에 대한 규제가 없던 시절 그 돈없는 혈혈단신들에게 외상술을 주던 술집 주인들은 (초기 단계의)금융업에까지 손을 뻗치게 된다. 술집에 갈 수 없었던 여성들은 (진을 마시던 하류층 여성을 제외하면)차가 그나마 대중화되면서 생겨난 찻집에서 차를 마시면서 그네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찻집은 뒷날 여성 참정권 운동의 산파가 되었다.
그러니까 저자에 의하면, 과장 좀 많이 섞으면 역사의 중요한 현장들에는 어딘가에는 항상 술이 자리하고 있었던 셈이다. 물론 그게 술에 특유한 효력은 아닐 것이고 결국은 사람들이 매개하는 장소에는 항상 술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의 매개가 결국 세상을 움직이게 되었을 것이다. 많은 미시사 책들이 그렇듯 이 책도 그런 매개가 어디에서 비롯했는지에는 무관심해 보이니 결국 책을 덮으면 ‘그래서 어쨌다고?’ 생각이 들곤 하지만, 그래도 술자리에서 지금 너와 나의 술자리가 결국은 소소하게라도 역사가 된다! 식의 드립을 날리기에 충분한 소재는 제공해 준다. 그런 실용성은 물론이고 역사책다운 재미는 확실하니만큼 그 정도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루스 볼 지음, 김승욱 역, 루아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