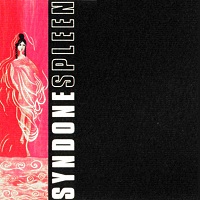Vinyl Magic이란 레이블을 알게 된 것은 Metamorfosi의 “Inferno”였다. 솔직히 이탈리안 심포닉록의 과장성을 좀 피로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이 앨범 또한 그런 이탈리안 심포닉의 병폐를 피해가진 못하고, PFM이 이미 1972년이 “Per Un Amico”를 내놓았으므로 당대 이탈리안 심포닉의 정점이라 하기도 뭐하지만 어쨌든 꽤 멋진 앨범이었다는 것도 분명해 보인다. 덕분에 꽤 안목 있는 재발매 전문 레이블이다… 라는 게 나의 레이블에 대한 첫인상이었는데, 이런 재발매 전문 레이블이 많이들 그렇지만 Vinyl Magic도 정작 자기들이 발굴한 밴드들의 앨범들은 딱히 신통치 못했다.
특히 90년대 이탈리아 프로그레시브의 신성들!을 세상에 내놓는다는 나름 야심찬 기획의 발로로 예상되는 Vinyl Magic New Prog 시리즈는 그 시절 반응이 실제로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나로서는 이 레이블을 SI Music 이탈리아 지부…마냥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솔직히 SI Music을 그리 싫어하지 않을뿐더러 그 호오를 묻는다면 나름 좋아하는 편이라 말할 수 있고 이 New Prog 시리즈 발매작들도 생각보다는 재미있는 구석이 있다고 느끼지만, 앞서 얘기한 이탈리안 심포닉의 병폐를 단적으로 체험하고 싶다면 이 시리즈를 들어보면 된다… 라는 게 사견. 당연하지만 아마도 이게 나만의 생각은 아닐 것인지라 이 시리즈의 앨범들은 이제 나온 지 거의 30년이 돼가지만 아직도 중고는 물론이거니와 무려 레이블 샵에서 (전부는 아니긴 하지만)재고떨이를 계속하고 있는 슬픈 처지에 있다. 덕분에 가성비는 무척 좋게 느껴지지만, 음악 얘기하면서 계속 가성비 언급하는 건 밴드 입장에서 좋을 일이 아닐 것이다.
어쨌든 우리가 접하면 일단 손창민 생각이 먼저 떠오르는 이름(신돈이라고 읽는 게 맞는가 몰라)을 달고 나온 밴드이 이 데뷔작은 그래도 이 New Prog 시리즈 중에서는 가장 눈에 띄는 음악을 하고 있다. 이 시리즈의 특징 중 하나가 거의 대부분 ELP 스타일의 프로그를 연주한다는 점인데, 이 밴드도 예외는 아니지만 다른 이들에 비해 재즈, 펑크 등 좀 더 다양한 면모를 받아들인 퓨전 느낌이 강하고, 1992년이었지만 동시대의 네오프로그의 문법을 전혀 따르고 있지 않다는 게 개성이라면 개성이겠다. 건반은 때로는 Le Orme의 좋았던 시절을 생각나게 하는 면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스타일도 다르고 기타도 없고 템포도 훨씬 빠른 이 음악을 Le Orme와 헷갈릴 일은 없을테니 너무 몰개성을 걱정할 것까진 없어 보인다. 빠른 템포 때문인지 전반적으로 5분 안쪽으로 짧게 끝맺으면서 긴장감을 유지하는 연주도 나쁘지 않고, 특히 ‘Il Sogno dI Sigfrido’의 몰아치는 건반은 인상깊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다만… 어째 이 밴드도 노래는 좀 그렇다. 밴드의 핵심인 Nik Comoglio가 건반연주에 바쁜 와중에 굳이 노래까지 하는데, Keith Emerson을 본받아서 마이크는 좀 놨으면 낫지 않았을까 싶다. 우리의 신돈 선생님들 아직 활동하고 계시니 이 정도는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
[Vinyl Magic,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