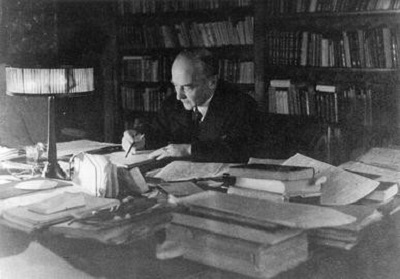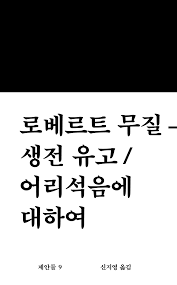
“특성 없는 남자”로 유명한 바로 그 작가, 로베르트 무질의 책이지만 나처럼 “특성 없는 남자”를 이름만 아는 문외한에게 저런 소개는 별 의미가 없다. 그보다는 대놓고 모순적인 책 제목으로 얘기를 시작하는 게 나을 것이다. 유고를 생전에 쓸 필요가 있나? 작가나 역자나 그 점을 잘 알고 있어서인지 작가는 서문에, 역자는 옮긴이의 글에 왜 작가가 생전 유고라는 제목을 붙이게 되었는지 친절하게 설명한다. 그 시절, 작가를 둘러싸고 있던 엄혹한 현실 속에 ‘이야 이러다 진짜 죽겠는데?’ 싶었던 작가가 살아남기 위해 일단 준비하고 있던 야심작 말고 그간 썼던 글들의 모음집을 내놓으면서 모음집 컨셉트 반 현실반영 반 정도로 붙인 제목이 저렇게 나온 셈이다.
물론 책을 읽을 때는 후자보다는 전자의 측면을 고려하여 읽는 게 더 나을 것이고, 생전 유고라는 컨셉트에 걸맞도록 작가는 ‘시대적 구속을 덜 받는’ 작품들을 엄선해 모음집을 만들었다. ‘지빠귀’를 포함하면 총 4개 장 30개의 소품들인데, 거의 2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발표된 작품들이지만 생각 이상으로 작가의 스타일은(다양한 장르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느껴지는 바가 있다. 출판사의 소개글에 나오는 작가가 글들을 선별 구성하면서 의도한 ‘하나의 구조’까지는 잘 모르겠다. 그보다는 뒤로 가면서 좀 더 사유를 발전시키는 형태로 글들을 늘어놓은 것처럼 보인다는 생각도 든다. 확실히 “지빠귀”는 제3장의 업그레이드 버전처럼 보이는 데가 있다.
“생전 유고”로는 분량이 부족했는지 함께 붙어 있는 “어리석음에 대하여”는 책의 적당히 두툼한 두께를 만들어 줌은 물론, “생전 유고”에 실린 소품들이 몇몇 작품들을 제외하고는 파편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현실에 대한 삐딱한 시선을 반영하고 있음을 다시금 실감시켜 준다. 이를테면 끈끈이에 걸린 파리의 생존에의 투쟁을 집요해 보일 정도로 정밀묘사하고 있는 “파리잡이 끈끈이”는 사실은 곤란한 시대상에 걸려든 그 시절의 사람들에 대한 우화라거나, “그림쟁이”의 주머니 사정 고약했던 화가와 작가들에 대한 냉소적인 정의는 사실상 스스로에 대한 독한 유머라거나 하는 것이다. 결국 어리석은 독자들은 작가의 의도에 농락당하면서 텍스트 너머의 내용을 내다보지 못하면서도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것이며, 이는 꼭 텍스트의 경우에 한정되는 얘기는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괴이한 유고집과 연설문의 결합은 독자로 하여금 너 자신을 알라고 ‘예술적으로’ 깨우치는 의도로 짜여진 모음집이 아닐까? 물론 작가가 보면 웃기지 말라고 할지도 모르겠다. 하긴 어리석은 독자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모른다고 앞에 써 놓지 않았나.
[로베르트 무질 저, 신지영 역, 워크룸프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