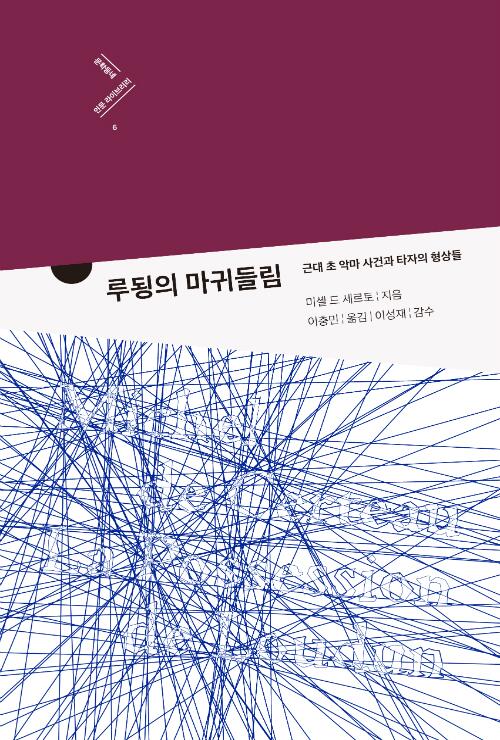
언젠가 끌려갔던 교회 수요예배 맨 뒷줄에서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방언’을 하던 어른들의 모습이 종교의 어느 한 단면인가? 라고 묻는 질문에 딱히 답을 해 준 사람은 아직 없었다(일단 주변에 종교인이 거의 없기도 하고). 혹자에 의하면 대충 1993년 즈음 한국 기독교의 교세가 조금씩 저물어 가기 시작하면서 이런 ‘방언’이 늘어났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이라고 친다면 이런 방언 등의 모습은 교회의 몰락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된 셈이다. 어려운 상황에서 집토끼들을 확실히 붙잡기 위해 고안된 ‘유사 의식’같은 것일지도 모르겠다. 정치인들도 한 표가 아쉬울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서는 쉬이 극단에 기대는 것처럼 말이다.
모르긴 몰라도 ‘방언’이 행해진다는 얘기는 꽤 꾸준히 들을 수 있었으니 거기에 목적이 있었다고 한다면 꽤 성공적인 의식이라 할 수 있을 것이고, 의식에 참여하는 이들이 그 의식의 의미에 대해서 의심하는지는 딱히 모르지만 적어도 외견상으로는 배울 거 다 배운 ‘이성적인’ 사람들이 대체 왜 저럴까 하는 의문은 쉬이 들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에서 다루는 ‘마귀들림’, 좀 거칠게 말한다면 마녀사냥 순한맛 버전은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는 방언과도 꽤 닮아 있어 보인다. 책의 묘사에 의하면 멀쩡하던 우르술라회 수녀들이 환각을 보고 몸을 배배 꼬면서 신성모독적 언사를 늘어놓았는데, 표현의 방향성이 좀 다를지는 모르지만 기묘한 스펙터클을 선사한다는 점에서는 둘은 꽤 비슷한 구석이 있다.
기묘한 스펙터클에는 그만큼 요란한 엑소시즘이 이어지고, 구마사들의 이 ‘종교적 방식’으로 해결되지 못한 마귀들림 현상은 국왕이 보낸 판사들로 이루어진 재판정으로 넘어가며, 세속적인 권력이 마귀들림을 단죄하면 의사들도 다소 미심쩍긴 하지만 마귀들림을 인정한다. 결국 이 기묘한 스펙터클은 그만큼이나 기묘한 방식으로 ‘과학적 방식’에 의해 마귀들림이라는 결론을 인정받는 셈이다. 저자는 이 괴이한 사건의 원인을 결국 권력의 문제에서 찾는 것으로 보인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외부에, 예기치 않게 부상하고 있는 역학관계에 있다.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문제인 것이다.”
그러니까 합리라는 이름이 결국은 뒤에서 움직이는 권력에 의해 붙여지는 셈이다. 같은 현상을 두고도 자신의 결론이 합리적이라도 다투는 이들이 많은 만큼 이런 결론은 나름 의미심장해 보인다. 뭐 그러니까 지금까지 방언이고 엑소시즘이고 남아 있을 수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 꼭 교회를 억지로 끌려갔다 와서 하는 얘기는 아니다.
[미셸 드 세르토 저, 이충민 역, 문학동네]

책은 읽어보지 않아 잘은 모르겠지만, 한국 기독교에서 방언만큼 기괴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의식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때 의도치 않게 교회에 다닌 적이 있지만 그 분위기와 환경이 어릴 때부터도 받아들이기가 힘들더군요. 지금도 비슷하지만… 다만 저도 이제 나이를 한해두해 먹어 가면서 왜 사람들이 종교에 열심이 되어가는지는 알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될런지는 모르겠네요 아마 어려울듯한ㅎㅎ
좋아요좋아요
가볍지 않습니다만 저는 (제대로 이해했는지는 둘째치고)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예수회 사제 출신 저자의 글이라기엔 놀라운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방대하다 보니 볼거리도 많습니다.
방언은 저도 되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영상물에나 나오는 건 줄 알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느낌이 많이 달랐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정상적인 종교의 모습’의 한계를 벗어난달까요? 덕분에 여태껏 한 번도 종교가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좋아요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