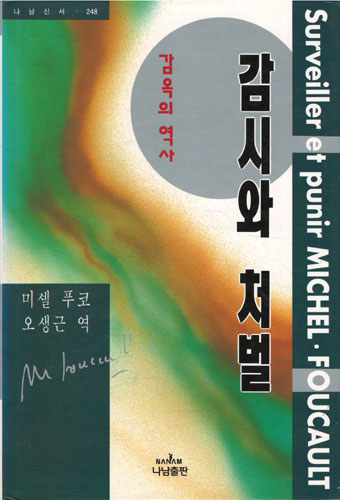
학문적 평가를 떠나서 철학이고 교양이고 잘 모르는지라 ‘푸코는 딱 하나밖에 못 읽어봤어요’라 말하는 이들이 읽어봤을 그 한 권이라면 아마도 이 책이 아닐까? 물론 이런 사실은 아무래도 고등학생들이 이 책을 읽고 오길 진심으로 기대했는지 추천 도서 100선에 이 책을 넣어놓은 서울대의 탓이 클 것이다. 하긴 나도 고등학생 때 처음 손에 잡힌 책이긴 한데, 손에 잡혔다 뿐이지 텍스트 자체는 소화불량을 일으키기 충분했으니 그 때 읽었다고 말하기는 좀 많이 그렇다. 어쨌든 푸코의 출세작이라면 출세작이면서, 어떤 면에서는 가장 접근하기 쉬운 책이라고 생각한다.
그 접근성은 무엇 때문일까? 일단, 이 책 덕분에 다미앙이라는 실패한 암살자의 이름을 기억한다는 사실이 보여주듯(실패한 암살자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례가 얼마나 되나?) 이 책은 서점의 철학 코너에 꽂혀 있는 여타 책들에 비해 상당히 자극적인 장면들을 포함하고 있다. 내용을 떠나서 책의 시작부터 나오는 이 사디즘적인 장면은 근대 이전 시대의 죄수에 대한 제재가 일종의 스펙터클로 작용했음을 설명하는 사례가 되는데, 뒤의 설명을 보기도 전에 사례에 대한 소개만을 보고도 눈앞에 그려질 정도이니 이 스펙터클한 장면에 대한 이론적 설명은 제대로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절반은 성공한 셈이다. (이런 효과는 조르주 바타이유의 책들에서 더욱 극명하게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자극적인 맛을 생각하고 이런 책들을 굳이 집어들 사람들은 아마 별로 없을 것이니 저런 이유가 전부는 아닐 것이고, 결국 다른 이유를 찾는다면 “광기의 역사”와 “말과 사물”, “지식의 고고학”이 모두 그랬듯이 “감시와 처벌” 이전의 저작들이 고고학적 방법론으로 주제에 접근하였다면, “감시와 처벌”에 와서는 계보학적 방법론으로 주제에 접근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기존의 고고학적 방법론으로는 하나의 사유 방식이 새로운 사유 방식으로 전환되었다는 사실 외에 그러한 전환의 원인에 대해서는 다룰 수 없었고, “감시와 처벌”에서 푸코는 계보학적 방법론을 통해 사유 방식의 전환이 이성에 의한 필연적 결과가 아니라 우연한 역사적 변화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감옥과 감금의 역사를 통해 보여준다. 누가 봐도 아날 학파스러운 흔적 많은 역사책 아닌 역사책이라고 할 수 있을까? 달리 말하면 자극적인 역사적 사실에서 이만큼 묵직한 썰을 풀어낸 사례는 그리 많지만은 않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도 암만 생각해도 나로서는 이게 고등학생 읽으라고 써 놓은 썰은 아닌 것 같다(하긴 고등학생 추천도서가 됐다고 그게 푸코 탓은 아니긴 하다). 뭐 세상에 똑똑한 사람은 수없이 많으니 그런 분들에겐 괜찮은가보다 하고 넘어간다.
[미셸 푸코 저, 오생근 역, 나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