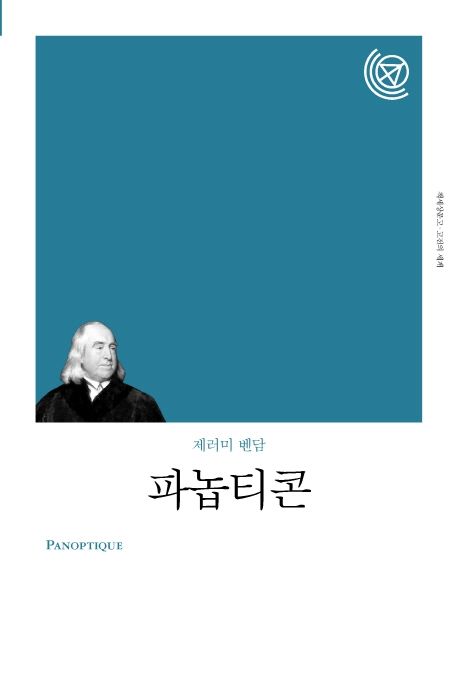
“감시와 처벌”을 읽었으니 이 책도 한번 간만에. 중학교 때부터 슬슬 교과서에 본격적으로 이름을 내밀기 시작했던(것으로 기억하는) 벤담이 교도소장을 목표로 프랑스 의회에 세일즈 삼아 집필했지만 저자가 저자인지라 일반적인 세일즈용 제안서 수준을 훨씬 초월한 결과물이 나온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말이 그저 교도소지 이 ‘파놉티콘’은 벤담이 일생을 걸고 구상했던 사회 모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현실화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 우리는 벤담의 시대에서 200년은 이후의 시절을 살고 있으므로 이미 벤담이 생각했던 저 사회 모델이 조금은 비정해 보이는 류의 유토피아에 가까웠음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벤담이 파놉티콘 한번 만들어 보려다 실패하고 파산했다는 역사적 사실은 공리주의의 운명을 얄궂은 방식으로 예견하는지도 모르겠다. 각설하고.
그렇게 공리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서 쓰여진 이 벤담식 ‘제안서’는 그런 만큼 파놉티콘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감옥의 필요성과 그 구상에 대해서 거의 낭비되는 부분이 없어 보일 정도로 집약적인 서술을 보여주지만, 그 빡빡한 가운데 가장 중요한 특성이라면 아무래도 감시자는 피감시자를 모두 볼 수 있으나, 피감시자는 감시자의 존재조차 완전히 확신하지 못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푸코가 ‘시선의 내면화’라고 부르는 지점은 이 부분일 것이고, 결국 근대 이후의 권력이 이와 같은 전략으로 개인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한다는 게 “감시와 처벌”의 핵심일 것이다.
하지만 푸코의 해석은 그렇다 치고 벤담 본인의 생각은 어떠했을 것인가? 벤담도 파놉티콘의 원리가 반드시 감옥이라는 분야에 한하는 것으로 보지 않았음은 분명해 보이지만, 파놉티콘의 중심에서 피감시자들을 살펴보는 역할을 자임하며 파놉티콘의 건축을 바라는 모습에서는 벤담 본인은 파놉티콘에서의 감시자의 시선을 온전한 통제보다는 좀 더 ‘시혜적인’ 것으로 보았을 것이다(일단 그 이전의 감옥보다는 좀 더 인도적이고 발전된 형태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세일즈맨의 자세에서 이런 글을 쓸 수 있지 않았을까? 이 책이 감시자로서의 권력을 휘둘러야 할 국가에 자신있게 그 권력을 ‘거 나 한번 믿어보고 맡겨주세요’ 식의 얘기였다면 제안서로서는 빵점짜리 문서일 것이다. 왕정이 공식적으로 전복되기 전이었으니 제3신분이 감히 자신들이 새로운 시대의 권력의 담지자임을 입 밖으로 얘기하기는 조심스러웠을 시대이기도 하다.
그러고 보면 모두가 바로 지금의 사람들보다는 조금씩은 더 ‘순진했을’ 시절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감옥 세일즈의 사례였을 것이다. 자신들이 다루고 있는 감옥 얘기의 파괴력을 몰랐던 셈인데, 하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서는 그 최대 다수가 저런 파괴력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더 좋아 보이긴 한다. 그런 면에서는 사회사상사에서 이만큼 노골적인 ‘실용서적’은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고, 벤담이 영향력에 비해 깊이는 의외로 얇다더라 하는 얘기가 나오는 지점도 여기일 것이다. 감옥 만들려다 파산한 것도 아쉬운데 벤담 입장에선 지하에서 뒤집어질 노릇이렷다.
[제레미 벤담 저, 신건수 역, 책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