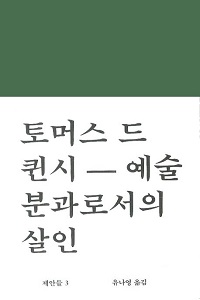
김동인은 “광염 소나타”에서 살인에 이르기까지 별별 범죄를 다 저지르면서 걸작을 남기는 예술가의 모습을 그리면서 걸작을 낳는 예술가의 광기에서 비롯된 범죄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날렸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 그 예술가가 예술이라고 펼쳐놓은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면 어떠할 것인가? 우리의 토머스 드 퀸시는 당대의 이름을 날리던 탕아답게 논쟁의 여지가 없도록 그 범죄를 살인으로 설정해 놓았다. 굳이 특정 사회적 배경에서가 아니라 아마도 거의 모든 시대와 사회에서 범죄로 볼 것이 분명할 사례는 살인만한 것이 없을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그럼에도 이 수기스러운 소설의 화자는 살인 애호가일 뿐, 스스로는 절대적 도덕성을 추구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점이고, 그러면서도 ‘뛰어난 살인’은 ‘웅대하고 숭고한 경지’에 이르는 예술이라고 밝히면서 ‘띄어난 살인’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과 그에 해당하는 다양한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며, 그 판단 기준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의 사례와 많이 닮아 있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방향은 다르지만 “감시와 처벌”에서 푸코가 제시하는 스펙터클과도 비슷한 셈이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오늘날 TV에서 가상의 이야기일지언정 그런 류의 스펙터클을 쉽게 볼 수 있다. OTT만큼 자극적인 맛을 따라다니는 것도 없다.
하지만 맛있는 거 찾아 먹다 보면 이거 건강에 안 좋은 건지 신경쓰이기 마련이라, 악인에게 서사를 주지 말라는 요구가 상식처럼 얘기되는 세상이 머릿속에 함께 떠오르고, 그러다 보면 애초에 저 요구가 정언명령처럼 되는 과정에서 나왔어야 할 이런저런 물음이나 충돌들이 어느 정도는 생략되어 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중요한 건 결국 심연을 들여다보다가 심연에 잡아먹히지 않도록 경계를 놓치지 않는 점일 것이다. 하지만 그럼 어디까지 해야 잡아먹히지 않는가? 그걸 답하지 못한 많은 사례들이 결국 악인에게 서사를 주지 말라는 요구를 만들어냈을지 모르겠다. 그런 면에서는 이 출판사가 내놓은 많은 역서들 중에서 시의성이라는 면에서는 본작만한 사례가 없을지도.
그런데 이런 책 읽고 시의성을 말하고 있으니 난 출판 쪽 일 하면 정말로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토머스 드 퀸시 저, 유나영 역, 워크룸프레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