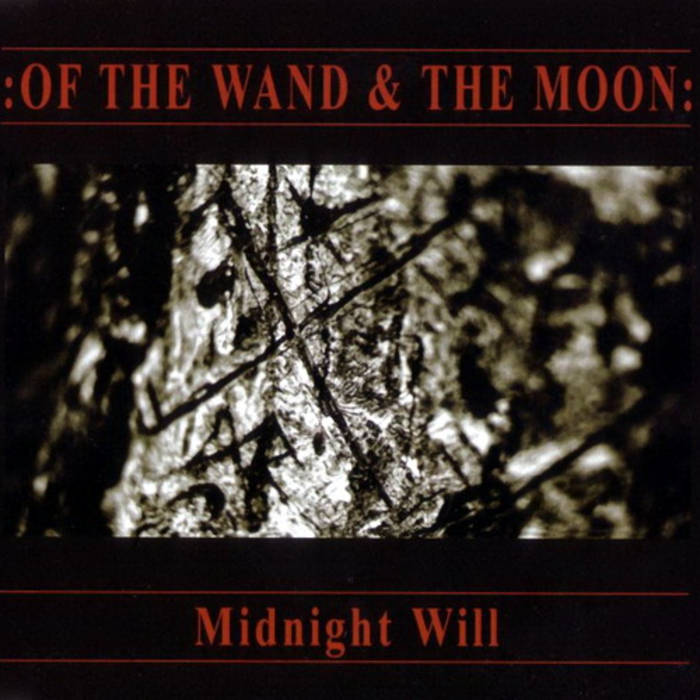
Of the Wand and the Moon의 장점 중 하나는 꾸준하게 계속 앨범을 지금껏 내 오는 몇 안 되는 네오포크 밴드이면서도 앨범 간에 기복이 별로 없다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밴드의 단점으로 흔히 얘기되는 것이 데뷔작부터 가장 최근의 “Nothing for me Here”까지 스타일상의 변화가 거의 없다는 점임을 생각하면 사실 이게 장점인지 단점인지는 조금 헷갈리는 감도 없지 않다. 하지만 이 회고적인 경향 짙은 장르에서 변화가 심하지 않다는 것을 단점이라기는 좀 지나치지 않으려나? 따지고 보면 Kim Larsen이 Saturnus 시절 보여준 스타일과도 연결되는 모습인만큼 그냥 어느 덴마크 뮤지션의 뚝심 같은 것일지도 모르고.
그런 의미에서 Of the Wand and the Moon의 최고 ‘문제작’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Midnight Will”이라고 생각한다. Death in June보다는 좀 덜 건조하고 감상적인 분위기의 포크이지만 Saturnus 시절 구력 덕분인지 밴드는 데뷔작에서 앰비언트 연주를 어쿠스틱 기타의 배경으로 삼는 데 익숙한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Winter Veil’이나 ‘A Dirge’가 그런 전개의 네오포크의 전형이라면 ‘A Mass’나 ‘Brace Yourself’의 기괴한 다크 앰비언트는 밴드가 이 EP에서 나름 새로운 시도를 의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실 그런 시도도 따지고 보면 Current 93이나 Blood Axis(특히 “The Gospel of Inhumanity”)가 이미 보여준 바 있으므로 마냥 새롭다 할 수는 없겠지만, Kim Larsen과 Boyd Rice를 애초에 비슷한 부류로 생각한 사람도 아마 거의 없었을 것이다. Of the Wand and the Moon의 곡이라고 생각하면 황당할 지경이다.
말하자면 (물론 모든 앨범이 비슷하긴 하지만)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밴드의 스타일이 비로소 자리잡은 건 이 EP에서라고 생각하고, 결국 밴드의 이후의 앨범들은 더 프로그레시브해지거나, 아니면 좀 더 분위기 위주의 전개를 보여줄지언정 스타일에 있어서는 이 시절과 큰 변화가 없었다. 네오포크라는 장르가 힘을 잃기 전에 마지막으로 장르의 대표작들을 쏟아내던 시기이기도 했을 것이다. 물론 장사 안 되기는 그때나 지금이나 매한가지였겠지만 말이다.
[Eis & Licht, 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