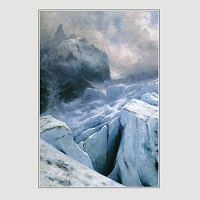바야흐로 Ved Buens Ende의 첫 데모. 뭐 유명하지만 사실 이 밴드를 좋다고 듣는 사람은 내 주변에서는 별로 찾아보진 못했는데, 개인적으로는 훗날의 소위 포스트-블랙이나 또는 Deathspell Omega류의 음악의 맹아는 이미 이들이 다 보여줬던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편이다. 밴드는 이 데모와 정규반 “Written in Waters”만을 내고 문을 닫았고, Czral은 이 밴드에서 못다한 다양하고도 괴랄한 실험들을 Virus를 통해 이어나가게 된다. 그러고 보면 원래부터 좀 뒤틀린 음악을 했지만 “The Black Flux” 이후 Virus가 갑자기 더 괴팍해진 이유는 이 밴드의 재결성이 아무 성과 없이 끝나버린 것도 있지 않을까 싶다. 각설하고.
“Into the Pandemonium”의 Celtic Frost와 “Red”의 King Crimson이 기묘하게 어울려 있지만 그런 바탕 때문인지 이 밴드의 음악은 블랙메탈의 면모를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마냥 메탈릭한 편은 아닌데, 사실 앨범을 느슨하게 관통하는 블랙메탈의 색채를 뺀다면 이들의 음악은 때로는 얼터너티브처럼 들리는 구석도 있을 정도로 극적인 구성을 보여준다. 그런 면에서 메탈헤드들이 듣기에는 좀 더 메탈릭한 이 데모가 “Written in Waters”보다 더 듣기 나을 수 있겠다. ‘Carrier of Wounds’는 “Written in Waters”에도 있는 곡이지만 격정이라는 면에서는 이 데모 쪽이 더욱 돋보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솔직히 연주는 “Written in Waters”가 더 정돈되어 있긴 하지만 뭐… 90년대 초중반 블랙메탈 데모 들으면서 연주 좀 느슨하다고 뭐라고 할 건 아니지 않은가. 무척 훌륭하다.
[Ancient Lore Creations,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