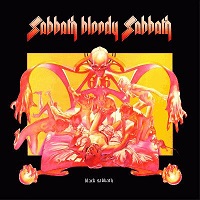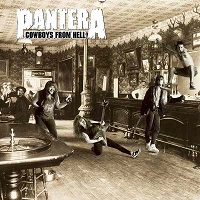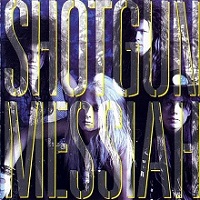
장르의 힘이 슬슬 빠져가고 있던 1989년에 등장한 게 생각하면 아쉬운 스웨디시 글램메탈 밴드. 한창 때는 헐리우드 헤어메탈에 대한 스웨덴의 대답이라고 불리기도 했고, 동향의 밴드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미국 스타일에 근접한 사례이기도 했으며, 특히나 암만 헤어메탈 소리를 들어도 좀 심각한 면모를 시도한 사례들도 등장했던 시절에 웬만한 미국 밴드들보다도 장르 본연의 파티음악 스타일에 충실했던 이 밴드의 앨범들 가운에서도 가장 장르 본연의 매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면 이 데뷔작일 것이다.
당장 Mötley Crüe를 연상케 하는 ‘Bop City’부터가 밴드의 색깔을 그대로 보여주는데(이 앨범은 원래 ‘Welcome to Bop City’라는 이름으로 발표되었다), 그렇지만 아류작에 머물지 않고 밴드는 ‘Shout it Out’에 와서 흔해빠진 Mötley Crüe의 유사 밴드를 넘어서고, ‘The Explorer’나 ‘Dirt Talk’(L.A. Guns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에서는 테크니컬한 연주와 함께 이 밴드가 ‘헤어메탈’ 이상의 모습도 보여줄 수 있음을 확인시켜 주며, ‘Nervous’ 같은 곡의 ‘건강한’ 코러스와 키보드 연주는 이들이 80년대 헤어메탈의 전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놀자판 연주에 최적화된 보컬인 Zinny J. San의 목소리에서 엿보이듯 이 앨범에서 어떤 헤비 사운드 같은 걸 기대할 순 없겠지만 애초에 Shotgun Messiah를 알고 찾아듣는 이라면 굳이 이 앨범에서 그런 걸 기대하진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만 밴드의 수명은 그 시절 비슷한 입장의 많은 밴드들이 그랬듯이 길지 않았고, 밴드는 나름의 시도들을 하다 못해 “Violent New Breed”에서 웬 인더스트리얼을 시도했다 화려하게 산화해 버렸으며, 밴드의 핵심이었던 베이스의 Tim Skold는 그게 되게 아쉬웠었는지 이후 솔로작은 물론 KMFDM이나 Marilyn Manson에서 못다한 인더스트리얼 쑈를 계속하고 있다. 그 음악도 팬이 있겠지만 이제 그만하고 이 밴드나 재결성했으면 좋겠다.
[Relativity, 1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