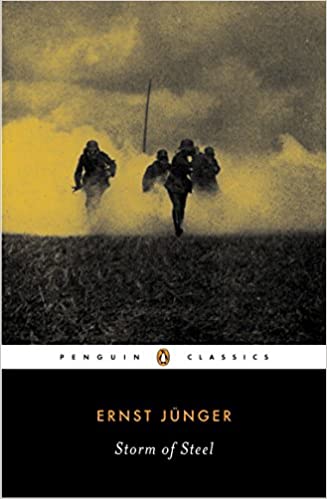Rush는 일찌기 본격적으로 프로그 물을 먹기 직전 “Caress of Steel”에서 ‘I Think I’m Going Bald’를 불렀다. 지금이야 할아버지가 돼버렸지만 그 시절에는 20대 초반의 혈기가 남아 있었고, 프로그보다는 하드록 밴드에 좀 더 가까워 보였던 밴드에게도 탈모는 불안의 대상이었다. 물론 저 노래는 대머리를 한탄한다기보다는 지나온 젊음과 시간을 아쉬워하는 노래였고(그럼에도 앨범에서 가장 처지는 곡이기는 했다), 우리는 이후의 역사를 통해 Rush가 그런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밴드를 끝맺는 그 때까지 멤버 전원 탈모인과는 거리가 멀었음은 물론, 사실 마음만 먹는다면 이 분들이 돈 없어서 머리 못 심을 분들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다. 별로 탈모를 무서워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보이는 이들에게도 탈모는 경계 대상이었던 것이다.
그럼 대머리에 대한 경계는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 이 정보화 시대도 쉬이 답을 주지 못하는 질문이지만 이 책은 그런 경계가 꽤 옛날부터 시작된 것임을 알려주고 있다. 키레네의 시네시오스가 겨우 후대에게 그런 정보를 주기 위해서 이 책을 쓴 건 아니었겠지만 이 책이 알려주는 효용성 있는 정보는 사실 거기까지다. 황금 입의 디온과 시네시오스 간의 현란한 말싸움이 그대로 담겨 있긴 하지만, 아마도 이 책에 나온 시네시오스의 논변을 가져와 이제 와서 스스로의 탈모를 변호했다가는 모두의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상황에 이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사실 시네시오스 본인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스스로도 논변을 시작함에 앞서 디온의 머리카락 예찬에 상당한 내상을 입었음을 고백하면서 책을 시작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래서 이 책이 대머리를 예찬하고는 있지만, 이 책을 죽 훑어보는 중에 독자는 이걸 다 읽는다고 해서 대머리에 대한 자신감이 생겨난다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사실(그리고 사실은 아마도 읽기 전부터 잘 알고 있었을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특히나 간통을 가장 질이 나쁘고 해로운 행실로 설명하면서 이는 ‘머리털이 달린 부류에게서나 찾아볼 수 있는 일’이라고 설명하는 지점에서 아마도 탈모인일 가능성이 높을 독자는 이 책이 그 때부터는 독자를 공격하고 있음을 발견한다. 해롭기 이를 데 없는 일인 불륜을 저지르려면 머릿결도 좋고 잘생겨야 하는데, 너는 대머리니까 그만큼 선량한 거라고 얘기하는데 수긍할 이라면 아마도 대머리보다는 이미 바닥을 친 자존감을 위해 다른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말하자면 이 책은 그 시절 어느 대머리 소피스트의 패배의 기록인 셈인데, 그래도 후대에 황금 입의 디온의 머리카락 예찬을 기억하는 사람들보다는 이 대머리 예찬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것이니, 그 부분에서는 시네시오스가 최후의 승자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을지도? 그야말로 피로스의 승리겠지만 말이다.
[키레네의 시네시오스 지음, 정재곤 역, 21세기북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