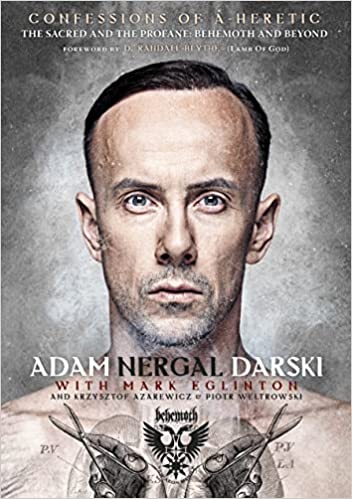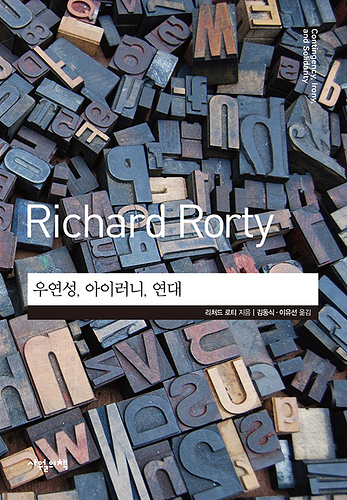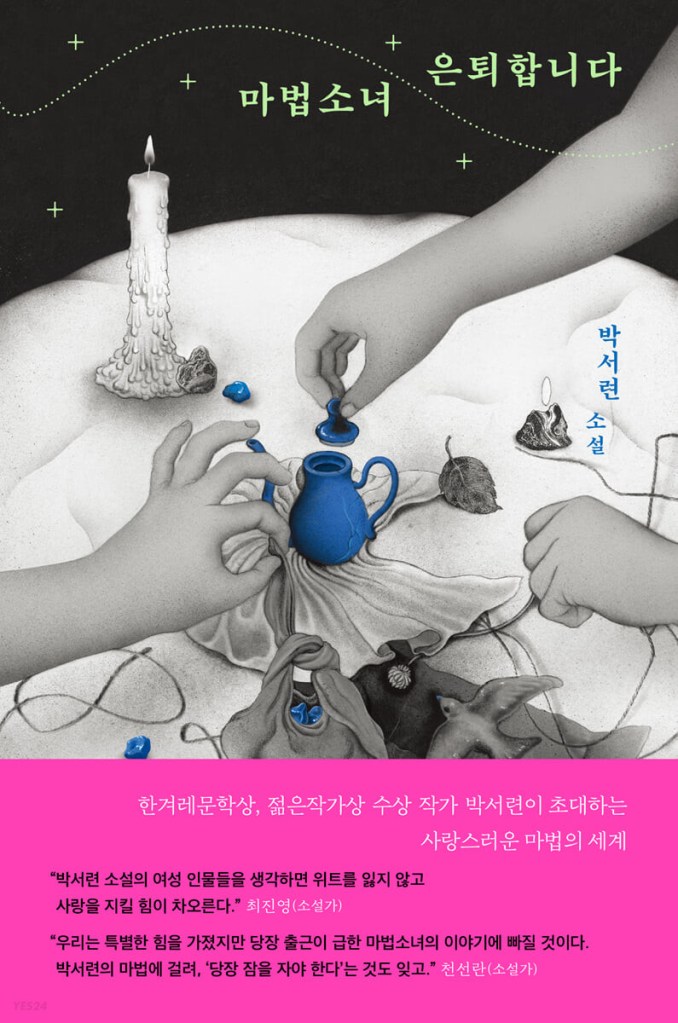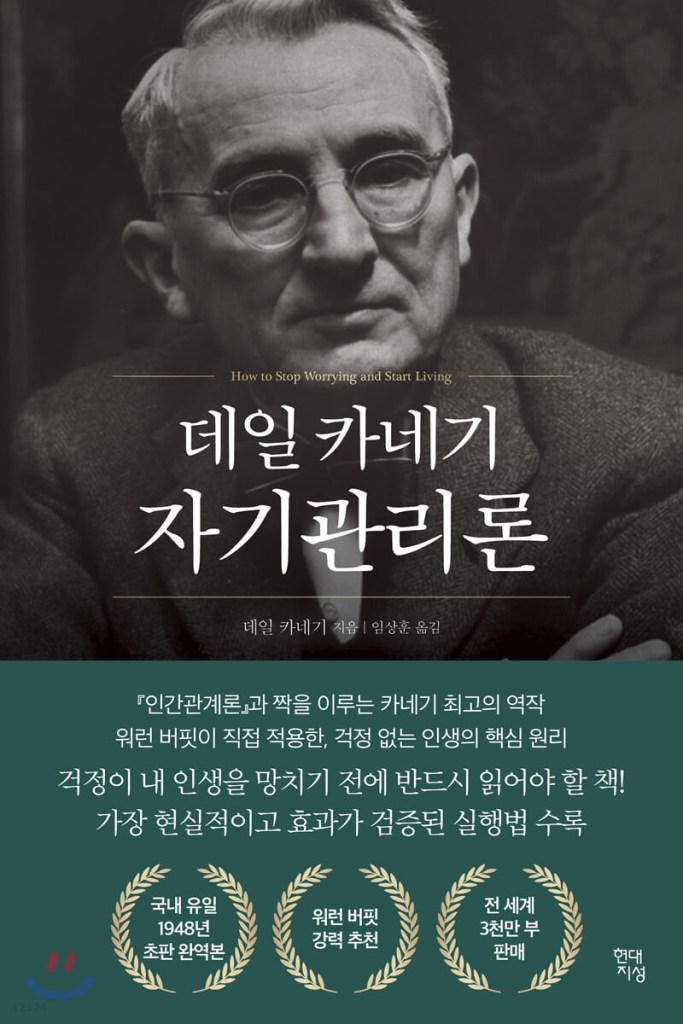Radiohead를 별로 좋아해 본 적이 없는 사람으로서(생각하면 이 정도까지 될 이유는 아무래도 없기는 한데) 이 책이 왜 책장에 꽂혀 있는지 정확한 이유는 나밖에 알 사람이 없건마는 잘 모르겠다. 아무래도 Radiohead로 철학을 한다니 괜한 지적 호승심이 어딘가 작용한 결과가 아닐까 싶다. Radiohead에 대한 찬사들을 보매 얼마간은 납득이 되면서도 또 삐딱해지는 게 사실인지라 이런 책을 읽고 전반적인 취지에 공감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물론 밴드보다는 귀 짧은 독자의 탓이 클 부분이다.
그래도 Radiohead에 대한 용비어천가식 책은 아니고, 그보다는 Radiohead를 단초로 삼아 대중음악에 대한 철학적 변을 늘어놓는 책에 가까운 편이다(하긴 Radiohead 정도가 아니라면 애초에 단초로 삼기도 어려울 것이다). Thom Yorke의 가사를 위주로 풀어나가는 이야기들이 많은지라 아무래도 실존주의적 시각이 많은 자리를 잡는다. 그래도 어지럽게 등장하는 이름들에 비해서 책의 논조가 그 정도로 어지럽지는 않다는 게 나름의 미덕일 것이다(특히 이 책은 개념 설명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다). Radiohead의 텍스트의 사회적 함의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Mark Grief의 글이 대표적일 것이다.
그러면서도 어쨌든 ‘음악’ 책인 이상 확실한 음악 얘기도 등장한다. Johnny Greenwood의 기타가 얼마나 클래식에 빚지고 있는지(특히 쇼팽)나, “Kid A” 부터 맞닥뜨리는 노골적인 일렉트로닉스의 ‘이론적 풀이’는, 평론은 결국 음악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는 이들에게는 꽤 우수한 사례로 꼽힐 만해 보인다. 물론 음악과는 상관없이 밴드 자신의 행동 윤리에 대한 내용에 가까운(그리고 적당히 선동적인) Daniel Milsky의 글도 있다. 록 얘기를 한다면 내용이야 뭐가 됐든 꼭 스피릿 얘기를 해야만 하는 이들이 있는 법이다.
개인적인 의문점이라면 Thomas Pynchon에 대한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Thom Yorke의 가사가 Pynchon에 빚진 바 많다는 건 사실 잘 알려진 얘기고, 리오타르와 포스트모던 등의 얘기를 하면서 한 번쯤 짚기는 참 좋아 보이는 내용인데 의외로 아무도 그 얘기를 하지 않는다. 얘기가 나왔더라도 이해가 잘 됐을까 하는 생각은 물론 들지만 어쨌든 그렇다.
[브랜든 포브스 외 저, 김경주 역, 한빛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