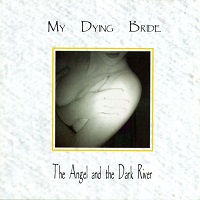바로 그 In the Woods…의 현 보컬리스트인 Bernt Fjellestad가 소시적 재직했던 파워메탈 밴드의 데뷔작. 지금도 생각하면 이 앨범이 어떻게 라이센스될 수 있었는지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S프로덕션에서 라이센스된 해외 메탈 앨범들은 장르도 그렇고 꽤 다양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이미 이름을 알린 밴드의 신작이나 유명한 구작을 내놓은 다른 장르에 비해 멜로딕 스피드나 파워메탈에서는 신진 밴드의 데뷔작이 많이 나온지라(Fairyland도 그렇고 Altaria도 그렇고) 적어도 그 장르에서만큼은 사장님 선구안이 많이 괜찮았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그럼에도 이 앨범은 지금까지도 중고시장에서 쉽게 볼 수 있는 S프로덕션 악성재고의 대명사…격처럼 되어 버렸고(당장 오늘 검색해도 4500원짜리가 나오더라), 들어보면 좋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내돈주고는 사기 싫게 생긴 저 커버도 그렇고, 20대 초중반이지만 시간을 지키다가 홀로 세월을 얻어맞은 양 지나치게 노련한 밴드의 외양도 아마 그런 결과에 한몫했을 거라는 생각까지도 드니 지금 이 앨범을 두고 선구안 어쩌고 하는 모습을 보면 사장님은 지금 놀리냐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는 진심이다. 해체하긴 했지만 데뷔작 이후 꽤 오랫동안 인정받은 밴드이기도 하고,
어쨌든 각설하고 음악 얘기를 한다면 앨범은 커버로는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수려한 파워메탈을 담고 있다. 일반적인 파워메탈보다는 좀 더 Stratovarius풍 멜로딕 스피드메탈 스타일에 기운 편인데, 듣다 보면 Hammerfall도 들리고 Avantasia도 들리고 하는 것이 밴드의 개성이랄 수도 있겠지만, 달리 말하면 저 Hammerfall스러운 부분이 일반적인 멜로딕 스피드메탈 팬에게는 그리 와닿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Soul Reaper’나 ‘High Octane’ 같은 곡의 수려한 리프는 4500원에 팔리기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 In the Woods…가 “Diversum”부터 보여준 묘한 파워메탈스러움이 여기에서 나왔구나 생각하면 더욱 흥미롭게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근데 파워메탈 팬이 In the Woods…를 들을 것인가? 하면 역시 의문을 감출 수 없으니 진짜 망할 운명의 밴드였던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든다. 아 불쌍하니까 한번 들어봐요 좀.
[Shark,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