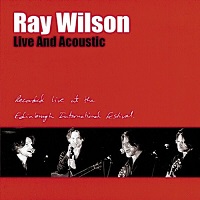
Phil Collins 이후 Genesis의 마이크를 꿰찬 Ray Wilson의 첫 솔로작? 하지만 제대로 된 솔로작이라기보다는 2002년의 시점에서 Ray Wilson이라는 보컬리스트의 그 때까지의 행보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어쿠스틱 라이브 앨범이라 하는 게 맞을 것이다. 사실 Genesis 경력 덕분에 이 솔로작을 구하는 이가 대부분이겠지만 그렇게 참여한 Genesis의 앨범은 “Calling All Stations” 하나 뿐이고, 앨범은 밴드의 커리어에서 손꼽힐 정도로 폭망했으며, Ray가 Genesis 이전 몸담았던 Stiltskin도 인디/얼터너티브라 할지언정(영국식 포스트 그런지랄까?) 프로그레시브와는 거리가 먼 음악을 했으니 애초에 Ray Wilson을 프로그레시브 뮤지션이라 하는 자체가 좀 어렵긴 하겠다. 하지만 레이블도 Inside Out이고 앨범의 1/4 정도는 Genesis의 커버로 채우고 있는만큼 결국은 Genesis의 팬층을 노렸음은 분명해 보인다. 뭐 그러니까 나도 이 앨범을 구해서 갖고 있는 거겠지.
그래도 이 보컬리스트와 기타, 건반까지 3명의 단촐한 편성으로 보여주는 이 라이브에서 Genesis의 프로그레시브를 기대하면 곤란하다. 애초에 커리어부터 프로그레시브보다는 호소력 있는 목소리의 팝 보컬에 가까운 Ray Wilson이고, 결국 앨범의 중심에는 Stiltskin때부터 함께 해 온 Steve Wilson(Porcupine Tree의 그 분이 아님)의 곡들과 Bob Dylan과 Bruce Springsteen, Eagles의 커버가 있다. Ray가 마이크를 잡기 이전 Genesis의 주요 넘버들의 커버도 있지만 Genesis의 팝 센스도 애초에 범상치 않았음을 확인시켜 주는 선곡인지라 본격 프로그레시브 록을 기대할 수는 없다.
하지만 Ray Wilson의 기량만큼은 확실히 출중하다. 허스키한 부분에서는 확실히 Peter Gabriel을 떠올리게 하는 구석이 있고, 아마도 Mike Rutherford와 Tony Banks도 그걸 보고 Ray를 새로운 보컬로 선택하지 않았을까? 애초에 Genesis가 끝장나고 몇 년 뒤에야 나온 이 라이브앨범을 두고 어째서 Genesis답지 않느냐고 하는 것도 우스울 일이다. 오히려 다양한 스타일들을 자신의 목소리 아래 모두 녹여내고 있으니 Ray Wilson이라는 보컬리스트의 기량을 엿보는 데는 이만한 앨범도 없다고 할 수 있을지도.
[Inside Out, 2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