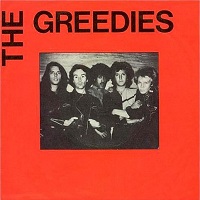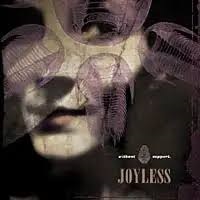2026년 극초반에는 뭔가 프로그를 많이 듣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새해에 가장 많이 손이 갔던 앨범은 이 Stern-Combo Meissen의 데뷔작. 사실 구동독 출신 크라우트록의 보석!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보통이라지만(여기에는 Julian Cope 등 그 시절 독일 록이라고 하면 박수부터 치고 보는 이들의 죄가 없지 않으리라) 결국 극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 그 시절 크라우트록은 브리티쉬 프로그레시브의 빛나는 유산을 터잡고 있었고, 이들의 경우는 그래도 그런 유산을 재현하는 데 나름의 성공을 거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해 보면 자기들 사는 동네명을 따서 ‘Meissen의 별’이라고 밴드 이름을 짓는 저주받은 센스에도 불구하고 2026년 어느 동방의 못생긴 사나이가 그 이름을 알고 있다는 자체가 꽤 성공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
그렇다고 이 앨범이 브리티쉬 프로그레시브의 성공작들에 비할 만하다고 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 어쨌든 데뷔작부터 라이브앨범으로 내 버리는 패기로 멤버 중 3명이 건반을 잡아 꽤 풍성한 심포닉을 펼쳐내는만큼 장르의 애호가라면 충분히 즐겁게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기타가 없으면서 신서사이저가 전반에 나서는만큼 ELP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특히나 ‘Eine Nacht auf dem Kahlen Berge’는 ELP가 무소르그스키를 연주했던 걸 따라했다고밖에 할 수 없지 않을까? 그래도 ‘Mütter gehn fort ohne Laut’나 ‘Licht das Dunkel’의 심포닉에서 묻어나는 멜로우함은 Keith Emerson 같은 연주자라면 아마도 보여주지 않았을 모습일 것이다. 곡만 좀 덜 산만했다면 심포닉 프로그의 걸작이라 해주는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 싶다.
하지만 때는 1977년이었다. “Brain Salad Surgery”가 나온 지도 벌써 4년이 지나버렸고 “Relayer”보다도 1년이 더 늦은 시절에서 이 정도 심포닉을 보여준 밴드가 로컬로 남았다 한들 이상하진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듣기 좋긴 한데 독일 프로그에 이상한 환상을 심어준 Julian Cope에게 이 대목에서 각성을 촉구한다. 대체 여기다 쓴 돈이 얼마냐 이거…
[Amiga, 1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