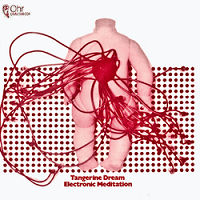Kingdom Come을 좋아하냐고 묻는다면 꽤 그런 편이라고 말할 수 있고 소시적 서울음반이 아마도 비교적 야심차게 라이센스했을(야심이 없었다면 이런 걸 라이센스할 리 없다고 본다) “Twilight Cruiser”가 종로 뮤직랜드 한켠 재고떨이 코너를 호령하는 와중에도 그 앨범을 꽤 자주 들었던 사람이라지만 이 라이브앨범의 커버는 지금도 무슨 생각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렇게 앨범의 내용물과 상관없이 커버에 시원하게 극지방의 풍경을 박아넣은 사례로는 대표적으로 Messiah의 “Extreme Cold Weather”를 꼽을 수 있겠지만 어쨌건 앨범 제목이라도 무지무지 추운 날씨였던 Messiah에 비한다면 이쪽이 더 심각하지 않나 싶다. 국적만 스위스지 헝그리하게 그지없어 보이던 Messiah에 비해 그래도 4-5년 전만 해도 Polydor에서 앨범이 나오던 밴드였음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그런데 말하고 보니 이 앨범도 스위스 바젤 라이브란다. 스위스가 뭔가 터가 안 좋아 보인다)
그래도 앨범은 꽤나 수준 높은 라이브를 담고 있다. 벌써 문닫은 지 한참 된지라 공연을 실제로 볼 일은 요원한 이 밴드의 유일한 공식 라이브앨범이라는 가치도 있고, 딱히 빛 본 적은 없었지만 밴드의 좋았던 시절이라면 시절일 “Twilight Cruiser”까지의 주요 넘버들을 망라하고 있다는 점도 있고, 애초에 이 밴드의 최대 강점이 Robert Plant의 좋은 점들을 꽤나 훌륭하게 따라가고 있는 Lenny Wolf의 보컬임을 생각하면 Lenny의 목소리가 이 라이브에서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에너지가 넘치는 라이브라고 한다면 그건 좀 거짓말이겠지만 오리지널을 거의 그대로 재현하는 듯한 흠잡을 데 없는 퍼포먼스라기엔 부족함이 없다.
다만 2CD의 경우 ‘You’re Not the Only’는 뭐하러 두 번 연속으로 굳이 넣어 두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차라리 ‘Get It On’ 같은 히트곡이라도 끼워 넣는 게 좋지 않았을까 싶지만…. 그런 센스가 있었다면 이 밴드가 이렇게까지 묻히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도 드니 그게 팔자려니 싶다. 새삼 좀 아쉽다.
[Viceroy Music,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