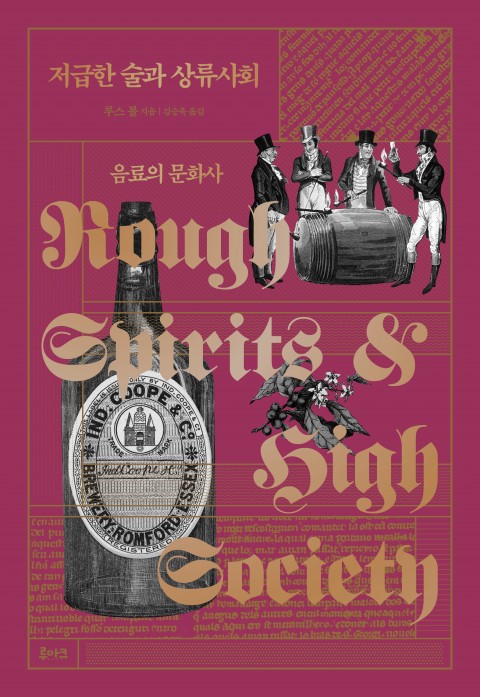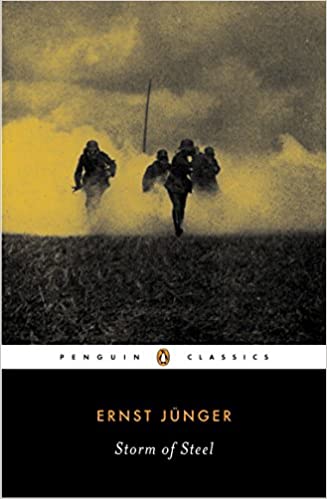
두 번의 세계대전으로 세상이 거의 망할 뻔했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체득한 이들이 떠나가고 교과서를 통해서만 그 사실을 간접체험한 이들이 세상을 움직이기 시작해서인지 이후로도 세계 어디에선가는 크건 작건 전쟁이 계속되어 왔다. 그러고 보면 유려한 필치로 전쟁의 참상을 고발한 많은 반전 문학가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작품들이 실제로 전쟁을 막는 데 보여준 기여는 그 필치에 대한 세상의 찬사만큼 대단한 것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있다. 말하자면 세상을 움직이는 데 그런 예술 작품은 아마도 전위로서 역할을 수행하긴 어렵지 않을까, 기껏해야 세상을 움직이는 현상의 가운데에 놓이게 될 어느 주요 인물에게 행동의 당위, 아니면 구실을 던져주는 정도의 역할만이 허락된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이다.
그런 반전 문학가들과는 달리 몸소 참호전을 경험하고 전율의 미학을 설파한 Ernst Junger는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달리한다. “Storm of Steel”의 두 번째 문단은 그 시절, 참호전을 받아들이던 어느 병사(라기보단 작가 본인)의 자세를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We had come from lecture halls, school desks and factory workbenches, and over the brief weeks of training, we had bonded together into one large and enthusiastic group. Grown up in an age of security, we shared a yearning for danger, for the experiene of the extraordinary. We were enraptured by war. We had set out in a rain of flowers, in a drunken atmosphere of blood and roses. Surely the war had to supply us with what we wanted; the great, the overwhelming, the hallowed experience. We thought of it as manly, as action, a merry duelling party on flowered, blood-bedewed meadows. ‘No finer death in all the world than…’ Anything to participate, not to have to stay at home!
물론 우리는 역사 공부를 통해 이 모험에 찬 가슴을 안고 전쟁에 참여한 젊은이들의 기대와 참호전의 실상은 많이 달랐다는 점을 알고 있지만, 우리의 주인공은 놀랍게도 마지막 순간까지 그 ‘모험에 찬 가슴’을 잃지 않는다. 저격수의 총알이 가슴을 관통하는 순간까지도 ‘내 인생의 가장 깊은 의미와 형식’을 운운하며 거의 즐겁기까지 했음을 고백하는 모습은 작가의 자신있는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후대의 독자에게 지독한 아이러니를 던져준다. 말하자면 군복무 시절 갖은 악폐습을 겪었던 경험을 덤덤하게 얘기하면서 그래도 그 시절 낭만이 있었어! 한들 그 이야기를 미적분 수업 듣는 수포자의 마음으로 잠자코 듣고 있던 어느 미필자가 군복무를 부푼 가슴으로 기다리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선 이 책은 反戰 아닌 反轉 문학이라 할 수 있겠다. 심지어 작가 본인조차 전혀 의도치 않았던 방향으로 책이 읽히게 되는 정도의 엄청난 反轉인 셈이다. 그러고 보면 어느 선을 넘어선 예술 작품은 결국에는 창작자의 손을 떠나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종국에는 창작자의 의도까지 뛰어넘을 수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펜으로 남을 계도하려거든 이런저런 문학적 기교보다는 스스로의 생각을 가다듬는 것이 결국 관건일 것이다. 형편없는 필력의 소유자로서는 다행스러운 일이다.
[Ernst Junger 저, Penguin Boo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