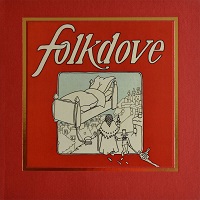이 호주 밴드를 데스메탈과 블랙메탈 중 어느 한쪽으로 얘기하긴 꽤 난감하다. 그렇다고 blackened-death 정도로 얘기하기엔 저 용어에서 떠올릴 법한 일반적인 스타일과 꽤 판이한 편이다. 이런 류의 음악이 통상 공격성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면 이 밴드는 그보다는 방향성이 좀 다르다. 테크니컬 데스로 시작한 밴드가 Ved Buens Ende류의 블랙메탈에 관심을 가지면서 방향성을 튼다면 나올 법한 음악이라고 할까? 그런가하면 꽤 분위기에 의존하는 전개도 심심찮게 보여주는지라 잘라 얘기하기 어렵다.
그래도 전작인 “Pest”가 좀 더 정통적인 구석이 있었다면 이 앨범에서는 Altar of Plagues 같은 밴드들을 열심히 들었는지 좀 더 뒤틀린 전개(과 때로는 Xibalba풍 하드코어 생각도 나는 사운드)를 찾아볼 수 있다. 덕분에 앨범의 구성도 좀 더 다양한 편인데, 괴팍한 재즈풍의 연주를 보여주는 ‘The Divine Light of a New Sun’과 멜랑콜리한 분위기의 ‘Synapses Spun as Silk’ 같은 곡이 한 앨범에 들어 있기는 그리 쉬운 건 아닐 것이다. 그런지라 일반적인 데스메탈 팬이라면 때때로 등장하는 먹먹한 질감의 연주에 거부감을 드러낼지도 모르지만 흥미로운 아이디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앨범임은 분명해 보인다. 일단 난 꽤 재미있게 들었다. 다음 앨범인 “Ascetic”은 이것과는 또 양상이 다르다고 하던데 구해 봐야겠다.
[Transcending Obscurity,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