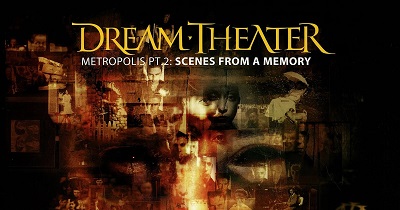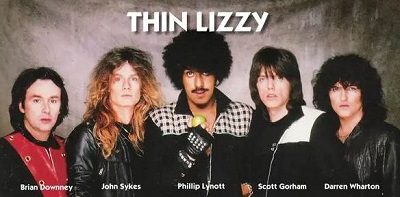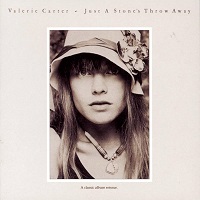The Negative Bias의 데뷔작. 사실 이 밴드에 관심을 가진 이라면 Golden Dawn의 Dreamlord와의 연결점 때문일 경우가 대부분이겠거니 싶고, 그나마도 Dreamlord는 이 앨범에만 참여했으므로 관심있을 만한 이들에게 밴드의 앨범 단 한 장만을 소개해야 한다면 아마도 이 앨범이지 않을까?
그렇지만 사실 이 밴드의 음악에서 Golden Dawn의 기운은 그리 느껴지지 않는다. 다만 복잡해진 끝에 Deathspell Omega까지 연상케 하는 이후 앨범들에 비하면 예전 오스트리아 블랙메탈의 기풍이 짙은 앨범이라고는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도 클래식하다는 뜻은 아니고 스타일 자체는 꽤나 모던한 편이다. Winterfylleth풍 바이킹도 있지만 Ulcerate 같은 데스메탈 리프도 있고, 보컬 자체도 전형적인 블랙메탈 보컬과는 거리가 있다. 이런 모습들이 다채롭게 어우러지는 가장 좋은 곡은’The Undisclosed Universe of Atrocities’일 것이다. ‘Tormented by Endless Delusions’ 같은 곡이 좋은 연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평이한 전개를 보여주는 데 비교하면 단연 돋보이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솔직히 앨범의 후반부는 2017년에 나온 블랙메탈 앨범들 가운데에서도 손꼽을 만하다고 생각한다.
들을 거 많은 세상이라지만 일청을 권해본다.
[ATMF,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