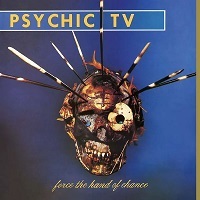프리미어리그 소식을 보다 보면 가끔 눈에 띄는 본머스라는 동네 출신의 하드록 밴드. 1972년에 이 한 장을 남기고 사라진 밴드지만 그 시절 뭐 그런 밴드가 한둘이 아닌지라 딱히 이 밴드가 눈에 띄어야 할 이유가 있냐면 많진 않아 보이는데 어째 나보다 먼저 음악을 들은 선배(다른 말로는 아재/아지매들)들은 사이키한 음악 좀 찾아 들었다 하면 이 앨범을 다들 알고 있더라. 그러니까 넷상에서 흔히 보이는 이 밴드가 ‘미스테리한 밴드’라는 류의 소개는 어찌 생각하면 좀 황당한 셈이다. 찾아보면 본머스에 있던 울워스 마트 체인점 근무자들이 모여 만든 밴드라는 얘기도 있던데, 진실이 뭐가 됐든 이 밴드에 대해 관심가진 이들이 많았다는 점만은 분명해 보인다. 각설하고.
Bram Stoker를 얘기했지만 드라큐라나 흡혈귀류와는 아무 상관이 없고 앨범명은 “Heavy Rock Spectacular”지만 헤비하지도 스펙터클하지도 않은 음악인지라 그런 면에서는 과장광고의 극을 달려간 앨범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어쨌든 Atomic Rooster 생각나는 오르간 묵직한 하드록인 만큼 그 시절 기준으로 하면 헤비하다는 것까지는 틀리지는 않다손 치기로 하자. 게다가 클래시컬하게 몰아치는 ‘Fast Decay’ 같은 곡을 보면 ELP 마이너 버전처럼 느껴지는 부분도 있고(사실 그보단 The Nice 생각이 더 많이 나기는 한다), ‘Poltergeist’처럼 흡혈귀는 아니더라도 조금은 스푸키한 분위기를 시도하는 곡들도 있다. 멘델스존의 오리지널을 나름대로 하드록으로 풀어내는 ‘Fingals Cave’은 피아노학원 집 아들로서 꽤 자주 틀어놨던 곡이기도 하다. 좋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드라큐라도 아니고 헤비하지도 않고 스펙터클하지도 않았지만 어쨌든 음악은 좋아서 지금껏 살아남고 있으니 어떤 의미에서는 진짜 음악으로만 승부했던 밴드라고 할 수 있을지도? 하지만 스스로를 ‘legendary progressive rock band’라고 소개하고 있는 밴드 홈페이지를 보면 멤버들 본인들의 생각은 나 같은 범인과는 좀 다를 수도 있겠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이 밴드를 전설이라고까지 띄워주는 건 좀 아니지 않나.
[Windmill, 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