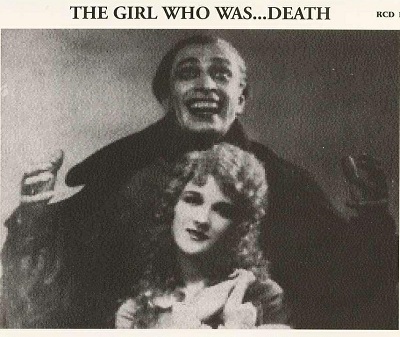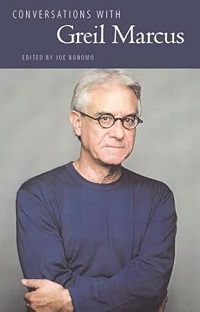학창시절 스쿨 밴드를 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많은 밴드들의 시작은 음악적 야심이고 뭐고 나도 밴드로 좀 멋지구리한 모습 보여주고 이성친구 한번 만들어보자! 식의 동기였음을 알고 있다(물론 모두가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님). 일단 그렇게 밴드를 시작한 다음에야 내가 노래를 멋들어지게 하는 보컬이 아닌 다음에야 어설픈 연주만으로는 이성의 눈길을 끌기 어렵고, 설령 부단한 연습으로 실력을 끌어올렸더라도 그 시간에 댄스 연습을 했더라면 훨씬 목적달성에 가까이 갔을 것이라는 진실을 깨닫게 되고, 곧 큰 맘 먹고 구했던 악기는 어느 방구석에서 먼지를 뒤집어쓰게 되는 게 보통이다.
그러니까 1990년 메탈 빠돌이로 소문난 어느 형제가 중심이 되어 결성된 이 밴드가 저런 마음가짐으로 가입할 만한 곳은 아니었음은 분명해 보이고, 겨우 약관의 나이에 내놓은 이제는 장르의 클래식이 된 셀프타이틀 데뷔작부터 이어지는 행보는 이 밴드의 음악적 야심이 보통이 아니었음을 능히 짐작케 한다. 그러니까 이 메탈 빠돌이 형제와 엉겁결에 밴드를 같이 하게 됐던 기타리스트가 여자친구 생겼다고 밴드에서 쫓겨난 사실은 – 지금 생각하면 웃기는 얘기지만 – 밴드의 방향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지도? 그렇게 떠나간 멤버를 이후 메탈 씬에서 찾아볼 수 없었으니 애초에 갈 길이 달랐구나 싶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게 ‘여자친구 생기기 전’ 녹음된 데모 “Unholy Death”를 구하는 건 쉽지 않았지만 2024년의 이 컴필레이션 덕분에 이제는 쉽게 들어볼 수 있게 되었다. 흥미로운 건 여자친구 때문에 떠나간 기타리스트 Morbid Slaughter의 연주가 꽤 괜찮다는 점인데, 기본적으로 D-beat에 기반한 전개에 블랙스래쉬의 기운을 불어넣는 것은 역시 기타다. ‘Satanic Sacrifice’는 Destroyer 666같은 장르의 모범을 연상케 하는 데가 있는데, 리마스터 덕분인지 기대 이상으로 훌륭한 음질 덕에 Nifelheim을 알고 있는 이라면 듣기 어렵지 않다. ‘Dawn of the Dark Millenium’을 빼면 이미 1집에서 들어봤던 곡이지만 데모답게 그보다는 더 거칠게 녹음되어 있으므로 취향 지저분한 귀라면 이 쪽이 더 맘에 드는 구석도 있을 것이다.
다만… 사실 “Unholy Death” 데모의 수록곡보다는 컴필레이션에 같이 실려 있는 1993년 데모와 커버곡들이 더 좋기 때문에 가끔은 굳이 “Unholy Death”라는 이름으로 내야 했을까 싶기도 하다. 뭐 어쨌든 밴드의 팬이라면 만족하기에는 충분할 것이다.
[Darkness Shall Rise,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