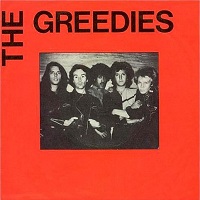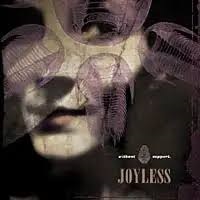비평가와는 거리가 먼 무지성 딜레탕트의 눈으로 보더라도 비평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비평의 위기 담론과 함께 매우 흔해빠진 얘기가 돼버린 것도 오래 된만큼 이제는 이런 현상을 두어 들뢰즈다 가타리다 하는 이름들을 빌려 시대착오적 주체성이니 이론으로 환원 불가능한 비평의 과잉이니 하는 얘기는 불필요해 보인다. 그렇다면 이어질 얘기는 아마도, 그렇게 비평이 위기라면 이 시대에 비평가들이 해야 할 ‘비평’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일 것이다. 음악에 대한 비평/평론이 무엇인지를 묻는다면 아무래도 어느 음악가의 창작물에 대한 소개나 평가가 일반적인 답일 것이라 예상되고, 비평/평론이 음악가의 작품에 종속되지 않고 스스로 나름의 의미를 담지하기를 원하는 입장이라면 비평/평론의 역할이 창작물에 대한 소개나 평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를 내지 않을까 싶다. 대개 넷상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국내의 ‘음악평론가/비평가의 역할’에 대한 얘기들도 비슷한 선상에 있었던 것 같다.
저자는 분석철학을 준거로 사용하면서 음악비평은 음악적 경험, 즉 하나의 음악을 듣고 그 음악에서 포착한 비개념적인 것들을 개념화하는 과정을 정교하고 엄밀하게 수행하는 것이라고 나름의 답을 머릿말에서 제시하면서, 그러한 입장에서 직접 정리한 개념화의 흔적들을 책으로 묶어서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생각한 음악에 대한 비평/평론의 의미에 대한 입장들에 비추어 본다면 아마도 저자는 후자에 가까울 것이다. 이미 존재하는 어느 창작물로부터 포착한 흔적들을 분석철학을 준거로 개념화한다면 그 결과물은 저자의 철학적 사유의 결과물일 테니 최초에 개념화의 대상이 된 ‘음악적 창작’의 결과물과는 이미 개념적으로 동일시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면 이 책은 결국 저자 나름의 음악비평/평론의 독자적 의미 찾기의 성과이지 않을까 싶다.
그렇지만 이 딜레탕트는 어쨌든 의문이 남는다. 어느 창작물에 대한 비평이 나름의 사유를 거쳐 독자적인 의미를 확보하였고, 음악을 사유를 통해 개념화하였더라도 독자가 개념을 통해 당초 비평의 대상이 된 음악을 재현할 수는 없어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걸 ‘음악 비평’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인가? 음악을 둘러싼 이런저런 배경이나 애초에 개념화의 대상조차 되기 어려울 저자의 의도 같은 불확실한 그림자들을 걷어내고 오직 ‘음악’ 그 자체만을 논고의 대상으로 하면 그게 ‘음악 비평’인 것인가? 이를 ‘음악 비평’이라 부른다면 그런 글들을 철학적 논고이되 그저 소재가 음악인 경우가 아니라 구별되는 ‘음악 비평’으로 만들어 주는 요소는 무엇인가? 이 책에서 그런 의문에 대한 답을 얻기는 어려울 것이고, 머릿말을 보자면 애초에 무학의 딜레탕트를 깨우치는 데 저자의 의도가 있어 보이지도 않으니 굳이 여기서 답을 탐구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그렇다고 여기서 정리하기엔 의문이 아직 끝나지 않는다. ‘음악’ 자체만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한 개념화가 ‘음악’과 분리된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면서 오히려 당초의 ‘음악’의 모습을 왜곡하는 결과가 되지는 않을까? 이를테면 노이즈 음악을 종래 음악이론에서 음악보다는 음향의 영역에 가깝게 받아들여지던 요소들을 음악의 영역에 편입시키는(또는 음악과 음향의 불명확한 경계 자체를 무너뜨리는) 기획의 결과물로 생각한다면, “노이즈는 ‘비음악적 소리’로 구성된 음악이다”라는 명제에서, 노이즈를 구성하는 소리를 ‘비음악적 소리’로 전제하는 위 정의의 모순을 지적하며 ‘고정 불가능성’이라는 개념에서 노이즈를 다시 파악하여야 한다는 논증은 애초에 번지수를 잘못 찾은 전제에서 시작된 것은 아닐까? 이런 식의 개념화는 어찌 생각하면 소위 전문가의 영역에 대한 대중의 도전이 심화되는 시절에 비평가 스스로의 전문가로서의 자리매김을 위해 필요한 작업이 아닐까?
그래서 책 뒤편에 적혀 있는 ‘저의 음악비평은 결국 또 미끄러지고 실패할 것입니다’라는 멘트는 마지막까지 기표와 기의를 놓지 못하는 집요함을 표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저자의 진솔한 한 마디처럼 보이기도 한다. 아직은 이 비평 작업이(재미와는 별개로) 무학의 딜레탕트에게는 그리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저자의 앞으로의 미끄러짐에 소리없는 응원을 보내본다. 재미있었다는 뜻이다.
[전대한 저, 워크룸프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