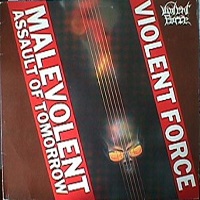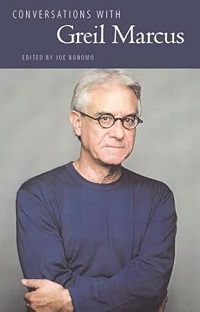
Greil Marcus와의 인터뷰 모음집? Lester Bangs만큼이나 그 분야에서는 유명한 분이기도 하고 어디까지나 음악이 중심이지만 여러 분야에서 폭넓은 인사이트를 보여준 점은 분명하지만, 음악 평론가가 뮤지션들을 상대로 진행했던 인터뷰들의 모음집이 아니라 바로 그 ‘평론가 선생’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모음집은 평론의 위기라는 말조차 흘러간 말이 되어가고 있는 지금에 와서는 더욱 생소해 보인다. 음악평론이라는 (필드라는 게 있다면)필드에서 현역 또는 그 지망생으로 살고 있다면 저서 한두 권은 접해보았을 이름인만큼 굳이 그 저서 말고 인터뷰 선집까지 읽어볼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이도 있을 것이다.
그래도 평론가이면서 동시에 평론가라기보다는 록스타에 가까워 보일 때도 있었으며 심지어 글조차도 음악과 동시에 자신이 중심에 있어 보였던 Lester Bangs에 비해서 확실히 좀 더 거리를 두고 음악을 논했던 것은 Greil Marcus였고, ‘나’를 내세우는 대신 이런저런 현상들과 사례들을 가져오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만큼, 보통 우리가 응당 음악평론이 갖춰야 할 덕목을 생각하매 떠올리곤 하는 이미지에 더 가까운 건 아무래도 이쪽이겠거니 싶다. 그런 면에서는 평소에 글에서 자신을 내비치지 않았다는 Greil Marcus의 시각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런 식의 인터뷰가 더 효과적일 것이다. Lester Bangs였다면(이런 류의 책이 나오지도 않을 것 같지만) 아마도 멋들어진 스피릿의 장광설이 등장했을 타이밍에서도 Greil Marcus는 비교적 물러서서 할 말을 조목조목 늘어놓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런 인터뷰였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Greil Marcus의 아카데믹한 측면 외에 그 개인적인 동기나 시각들을 드러낼 수 있었을 것이다. Journey를 싫어하고 Greatful Dead를 그리 좋아하지 않으며 Kenny Rogers를 사회적 의미는 그렇다치고 음악적으로는 재미없다는 입장을 드러낼 기회가 있었을까? 스와스티카를 가지고 노는 펑크 밴드들을 옹호하는 이들이 있었지만, 그 시절 유럽에서 스와스티카가 무슨 뜻인지 몰랐던 사람은 없었고, 그런 밴드들은 자신들의 행동의 의미에 대해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얘기를 Rolling Stones에서 쓸 수 있었을까? 어떻게 보면 (모두 정답은 아니더라도) 50년대부터 80년대 초반까지의 영미 대중음악에 대한 가장 유명한 평론가 중 하나의 시각을 가장 집약적으로 담아낸 책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거 말고는 두 권밖에 못 읽어본 사람이 하는 얘기므로 아니라면 아마 당신 말이 맞을 것이다.
[Joe Bonomo 저, University Press of Mississippi]